내일의 전통, 오늘의 관객을 만나다
월간국립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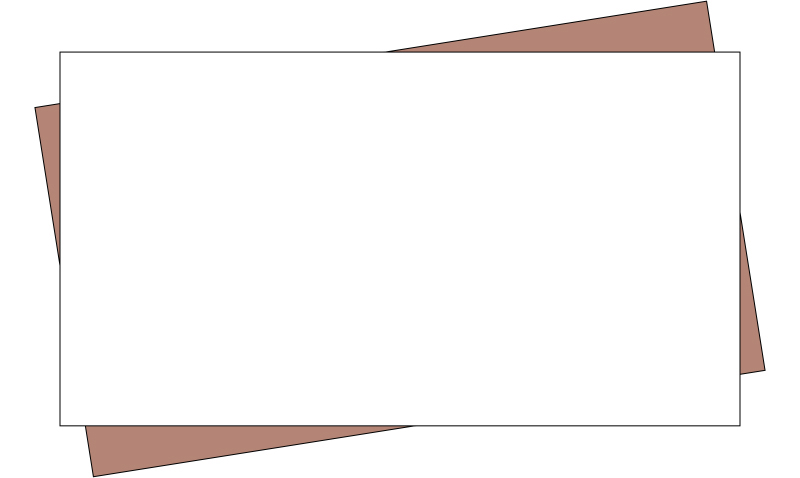
깊이보기
둘
<여우락 페스티벌>부터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까지.
올여름, 우리는 페스티벌에 간다. 축제를 ‘겪으러’ 간다.
2010년 시작된 이래 연인원 7만 명 이상을 국립극장으로 불러들인 <여우락 페스티벌>이 6월 30일 막을 열어 7월 22일까지 축제를 펼친다. 소리·굿·범패·농악·탈춤 등과 어우러지는 총 12편의 공연을 통해 이 시대 우리 음악의 비전을 말한다.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서울 잠실이 물총 싸움판으로 변했다. <워터밤 서울>이다. 국내 대표 야외 록 축제인 8월의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평화의 기치를 내건 힙스터 축제인 9월 강원도 철원의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도 개봉박두다.
특히 7월 말에는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가 경기 포천시 한탄강 다목적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것이 한국에서 어떤 형식과 분위기로 열릴지는 미지수. 하지만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는 그 자체로 페스티벌의 대명사이자 기념비다.
현대적 음악 페스티벌의 역사나 정의를 말할 때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를 빼놓을 순 없다. 최초의 페스티벌은 1969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주 베설의 드넓은 목장 지대에서 열렸다. 라비 샹카르, 멜라니, 존 바에즈, 산타나, 그레이트풀 데드, CCR, 재니스 조플린, 슬라이 앤드 더 패밀리 스톤, 더 후, 제퍼슨 에어플레인, 크로스비 스틸스 내시 앤드 영, 지미 헨드릭스…. 이름만 읊어도 숨 가쁜 당시 최고의 출연진이 3일 밤낮을 바통 터치하며 달궜다. 마지막 출연자는 지미 헨드릭스. 전날 밤의 폭우 때문에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18일 오전 9시에야 무대에 오른 헨드릭스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3일간의 광란에 지칠 대로 지친 관객들은 썰물 상태였기 때문이다. 헨드릭스의 모습을 흘낏 보고 서둘러 짐을 싸서 떠나기에 바빴다. 피크타임에 45만 명에 달한 관객은 헨드릭스 무대 때 2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파장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관객이 2만에 달했다니, 이 축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 초월이다. 당시 축제의 모토는 ‘3일간의 평화와 음악’이었다. ‘음악과 평화’도 아니고 ‘평화와 음악’이다. ‘사이키델릭’과 ‘퓨전’이 시대정신이던 그해는 1967년, 이른바 ‘사랑의 여름Summer of Love’이 지나가고 거대한 분출구가 필요하던 시기였다. 1969년 우드스탁은 영화 <컨택트> 속 UFO처럼 드넓은 광야를 해방구로 만들어버렸다.
‘페스티벌에 간다.’ 이 단문短文 안에는 사실 메저닌Mezzanine처럼 복문複文이 숨어 있다. ‘페스티벌에 간다’는 ‘콘서트에 간다’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이어야 한다. ‘콘서트에 (NCT를 보러) 간다’와는 다른 함의含意 말이다. ‘페스티벌에 간다’에서 ‘간다’는 ‘페스티벌에 (~한 경험을 하러) 간다’에 더 가깝다. ‘간다’ 앞에 ‘페스티벌을 경험하러·겪으러’가 더 어울린다는 얘기다. 체험,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체험과 경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적 체험. 종종 영적 체험을 가리킨다. 제이슨 므라즈는 몇 년 전 필자와 인터뷰하면서 자택 침대맡에서 요가 명상을 하다 성스러운 빛을 체험했고, 그를 바탕으로 대표곡 ‘I’m Yours’를 쓰게 됐다고 털어놨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이 정적·영적 체험일 것이다. 둘째는 동적 체험이다. 동적 체험은 나의 심신이 겪지만 보통 그 심신이 일상과 유리된 특별한 환경과 장소로 이동한 뒤 벌어진다.
독일 북동부의 레어츠Lärz에서 매년 6월 말~7월 초 열리는 <퓨전 페스티벌Fusion Festival>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축제의 다른 명칭은 ‘공산주의 페스티벌’이다. 21세기에 공산주의 축제라니 뜨악할 분들도 있으리라. 축제가 열리는 농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 비행장 부지였다. 입장권은 추첨제로 살 수 있고, 타임테이블은 축제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 페스티벌의 모토가 ‘공산주의로의 휴가’다. 관객, 아니 참가자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자력갱생해야 한다. 캠핑 비용은 무료지만 알아서 먹고살 거리를 챙겨 와야 하는 것. 와이파이 서비스 따위는 없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 인증하에 직접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팔기도 한다. 물론 여러 음악가의 공연 무대가 메인 이벤트이긴 하지만 이곳에 모여드는 매년 약 7만 명의 참가자는 기꺼이 스스로가 생산자이자 서로를 위한 관객, 소비자가 된다.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진)의 이름값이 중요했다면 이 사람들은 불편한 <퓨전 페스티벌>을 선택하지 않았으리라. 각자의 짐을 싸 들고 허허벌판에 모여 결국 마지막 날 ‘화형식’과 함께 다 태우고 끝내버리는 미국의 <버닝맨 페스티벌>의 극히 유럽적인 모델인 셈이다. ‘소련군 비행장’ ‘공산주의로의 휴가’ 같은 추상적 모토, 희귀한 분위기, 일생일대의 체험이야말로 콜드플레이, 브루노 마스를 거뜬히 이겨내는, 페스티벌의 간판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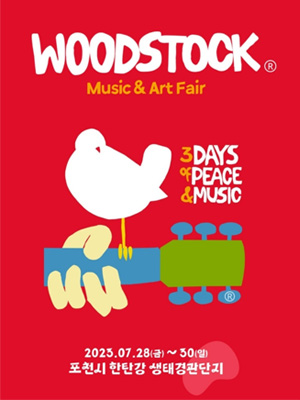
공산주의 페스티벌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특별한 체험을 한 적 있다. 2018년 8월 10일 핀란드 헬싱키. 시내 북동쪽에 위치한 폐발전소 터 ‘수빌라티’에 아침부터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멀리서 보면 버려진 공룡 뼈처럼 헬싱키시 외곽의 스카이라인을 뚫고 서 있는 20층 건물 높이의 적갈색 옛 발전소 굴뚝 4개는 <플로 페스티벌Flow Festival>의 상징적 모놀리스다. 매년 8월이면 발전소 터의 폐허나 미로 같은 부지 곳곳에 10개의 무대가 특설되고, 9만 명의 관객을 맞을 준비를 마친다.
<플로 페스티벌>의 명제는 재생과 지속가능성이다. 폐자전거, 폐타이어,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설치미술이 무대 사이사이를 수놓는다. 우리 식으로 치면 <서울재즈페스티벌>, 미국식으로는 <코첼라 밸리 아츠 앤드 뮤직 페스티벌>쯤 되는 규모인데 휠체어와 목발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채롭다. 모든 무대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뒀기 때문이다. 축제 마지막 날 오후는 ‘패밀리 선데이’로 정해 10세 이하 아동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상영과 놀이 체험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설립자인 수비 칼리오, 투오마스 칼리오가 상상한 대안적 대형 축제가 현실이 됐다. 미국 래퍼 켄드릭 라마부터 실험음악가 테리 라일리, 한국인 DJ 예지, 우크라이나 출신 피아니스트 루보미르 멜닉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스펙트럼의 아티스트를 섭외하며 상업성과 음악성의 황금 조합을 추구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현장에서 만난 설립자 수비 칼리오 씨는 “여성 아티스트의 비율을 절반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만난 전자음악 듀오 ‘해파리’의 멤버들은 ‘힙하다’보다 ‘멋지다’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힙한 건 그때뿐이지만 멋진 건 영원하잖아요.” 경복궁 구찌 패션쇼보다는 언젠가 공산주의 페스티벌에 제대로 가보는 게 꿈이다. 공산주의자여서가 아니고 체험주의자여서다. 속칭 ‘굿즈’라 불리는 디자인 상품, 빛나는 라인업을 넘어 그곳에서만 겪을 수 있는 뭔가를 갈구한다. 나도 그렇고 MZ세대도 그러하며 알파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도 그러할 것이다. 물론 그 체험이 희귀하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니다. 낯설지만 흥미진진해야 하며 다채롭고 정신을 위한 영양가가 만점이어야 한다. 엔데믹을 맞아 페스티벌 시장은 포화 상태에 왔다. 2006년 출범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지난해 최다 관객 동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피크닉형 축제부터 EDM 페스티벌까지 각양각색의 장르와 분위기를 자랑하는 페스티벌이 ‘K-여름’에 가득히 넘실댄다. 양적 팽창을 충분히 이룬 지금, 우리도 우리만의 색채가 들어간 한국적 축제를 고민할 때가 왔다. 우리가 누구이던가. 배달시키기 전에 판부터 벌이던 마당의 민족 아니던가. 판소리 다섯 마당을 이야기할 때, ‘한판 크게 벌이자’고 큰소리칠 때 그것은 곧 총천연색 페스티벌과 다름없었다. 피맥(피자와 맥주) 먹으려 줄 서고, 라거 맥주 판촉 행사를 하는 페스티벌들 속에서 차별화된 먹을거리, 마실 거리, ‘겪을’ 거리가 푸짐한 새 판을 짤 때가 왔다.

페스티벌은 스펙트럼이다. 예술과 예술인의 다채로운 면면이 그리스식 샐러드처럼 뒤섞여 형광색 광채를 발산하지 않으면 ‘진짜 페스티벌’이라 부르기 민망하다.
콘서트가 산이라면? 페스티벌은 뜨거운 지각판이다. 꿈틀대는 운동성을 지면 깊이 묻어뒀다 폭죽처럼 이 산 저 산 폭발시키는 거대한 잠재력. 그 자체가 페스티벌의 실체다. 필부필부가 그 지각판 위에 모여 자신을 분출하면 감정의 언덕과 파고는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깨어진다. 그 위에 올라선 모든 구성원이 수많은 작은 축제 조각으로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셈이다.
앉고 서고, 부수거나 명상하고, 먹고 마시고 꿈을 꾸고…. 페스티벌은 분광기다. 회칠한 벽처럼 단조로웠던 밥벌이의 일상이 N개의 무대라는 분광기 앞에 서서 설렘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러다 끝내 무지개색으로 분출하는 장場이야말로 페스티벌의 시공간이다. 그러고 보면 산 위에서 외계인과 건반악기로 소통하고 UFO를 접선하는 <미지와의 조우>(스티븐 스필버그, 1977)야말로 어찌 보면 <프랭크>나 <킬 유어 프렌즈>를 능가하는 진짜 체험형 음악 페스티벌 영화였다.

월간지 '월간 국립극장' 뉴스레터 구독 신청
뉴스레터 구독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신청 가능하며, 다양한 국립극장 소식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월간 국립극장'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
※회원가입 시 이메일 수신 동의 필요 (기존회원인 경우 회원정보수정 > 고객서비스 > 메일링 수신 동의 선택)






